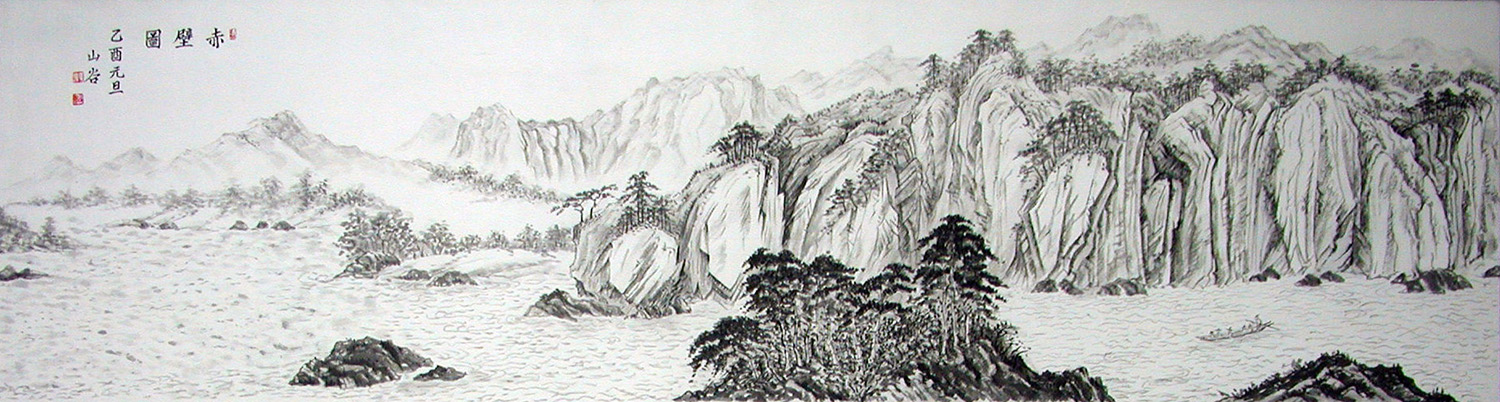작가 : 김수철(金秀哲)아호 : 북산(北山)제목 : 무릉춘색(武陵春色)언제 : 19세기 후반재료 : 족자 종이에 담채규격 : 150.5 x 45.6 cm소장 : 간송미술관해설 : 도연명(陶淵明)의 도화원기(桃花源記)에 나오는 무릉계(武陵溪)의 선경(仙境)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. 복숭아나무를 좋은 곳에 골라 심어 놓으면.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이 될수있다는 김수철의 자제시(自題詩)를 달고 있는 이 그림은. 제사(題辭)그대로 김수철이 창조해 낸 풍취있는 선경이다. 이렇게 보면 웃고 있는 사람 얼굴같기도 하고. 저렇게 보면 낙타가 걸어 내려오는 것 같은 모양의 머리를 이고 있는 배경의 산은. 마치 질 좋은 인림(印林)처럼 수려한 맛을 풍기며 솟아 있다. 들창을 받쳐 세운 야트막한 정자는. 휘우듬 버티고 선 긴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