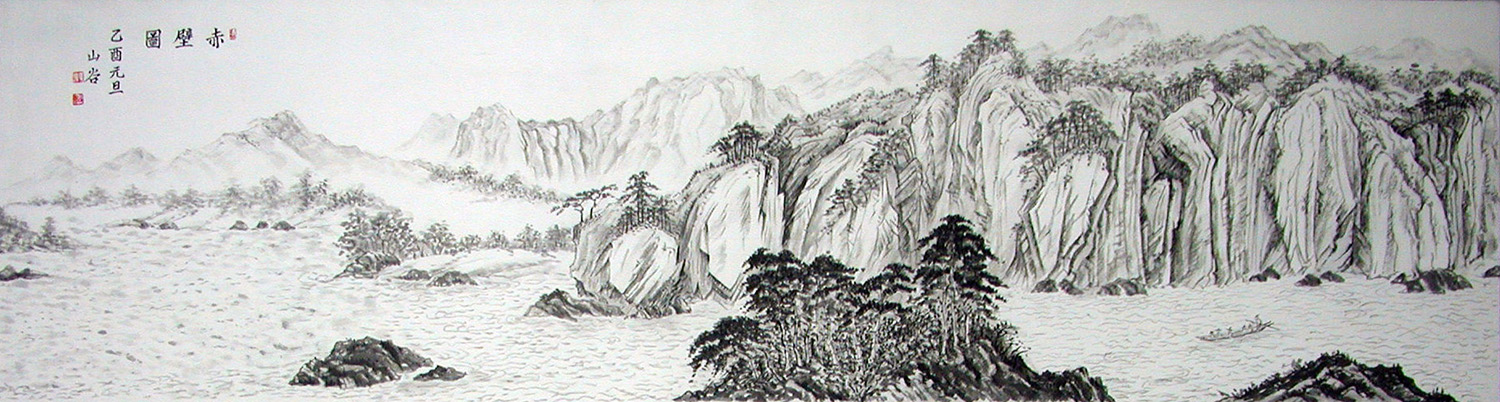象村 申欽(상촌 신흠). 寓興(우흥) 흥을 붙여 軒冕何關己(헌면하관기) 벼슬이 나에게 무슨 관계 있나琴書久委懷(금서구위회) 거문고와 책을 버린 지 오래로다道玄知物化(도현지물화) 도가 깊어 사물의 변화를 알고心靜與時乖(심정여시괴) 마음 고요하니 시대와 어긋나는구나樹影迎風亂(수영영풍란) 나무 그림자 바람 맞아 흔들리고山容過雨佳(산용과우가) 산 모양은 비 지난 뒤 아름답구나閑居足幽致(한거족유치) 한가한 삶에 그윽한 흥치에 만족하니休恠外形骸(휴괴외형해) 세상일 초월함을 괴이 여기지 말어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