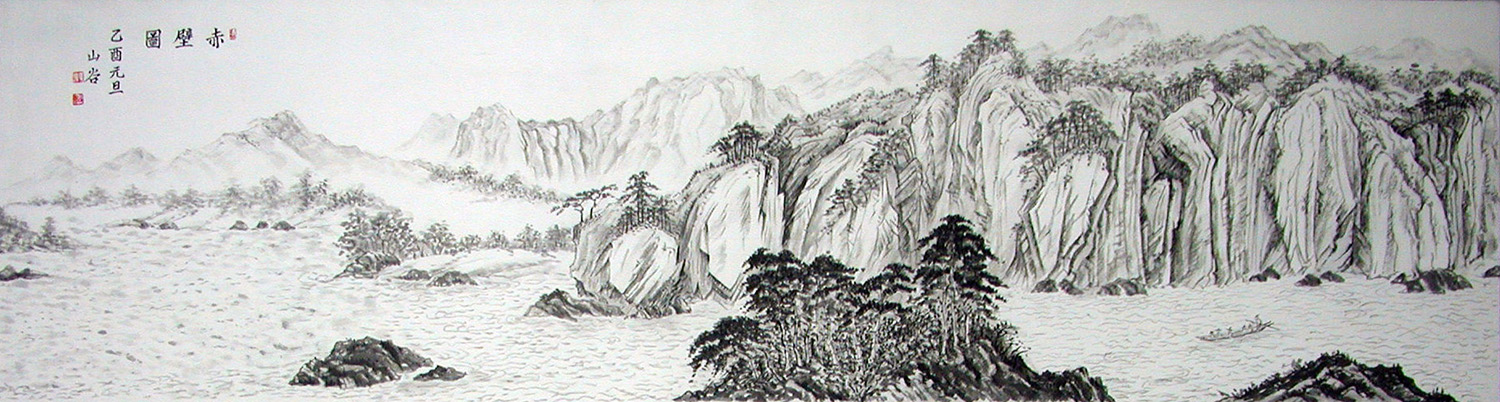佔畢齋 金宗直(점필재 김종직). 次陜川東軒徐參判金承旨韻1(차합천동헌서참판금승지운1)합천 동헌에 있는 서 참판과 김 승지의 운을 차하다 荏苒光陰馬上消(임염광음마상소) : 지루한 세월을 말 위에서 보내니長安回首轉遙遙(장안회수전요요) : 장안으로 돌아보니 더욱 멀기만 하구나春風滿眼堪傷別(춘풍만안감상별) : 눈에 가득한 봄바람 이별을 슬퍼하고劍氣橫空陡覺高(검기횡공두각고) : 창중에 뻗친 살기 문득 높아짐을 알겠네捫蝨淸談宜月夕(문슬청담의월석) : 이를 문지르며 나누는 청담은 달뜬 밤이 좋고持螯狂興負花朝(지오광흥부화조) : 게 다리 쥐고 미친 듯한 흥은 꽃핀 아침을 저버렸구나澄心樓下寒溪水(징심루하한계수) : 징심루 아래를 흐르는 차가운 개울물醉拍欄干燭鬢毛(취박란간촉빈모) : 술취해 난간 치니 귀밑머리 촛불처럼 ..